6월 2일 당포 해전에서도 거
페이지 정보

본문
그리고 6월 2일 당포 해전에서도 거북선이 등장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
이순신은 당포 전투의 전과를 보고한 장계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에서 "신(臣)이 일찍이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거북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앞에는 용머리를.
임진왜란사에 언급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충무공전서’에 기록된 당항포해전의 날짜가 1592(임진)년 6월 5일이고, ‘당포파왜병장’ 장계는 6월 14일 자에 작성됐다.
이 장계를 전생서 주부 이봉수가 행재소(의주)에 갖고 올라갔고, 교첩은 병조(兵曹)에서 7월에.
3차 거북선은 ‘이충무공전서(1795년)’에 있는 통제영 귀선을 근거로 하되 임진왜란 당대의 기록인 충무공의 장계(당포파왜병장, 1592년), 충무공의 조카 이분이 쓴 ‘행록(17세기 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료와 문헌 등 최근까지 축적된 연구결과.
흥양현에 머물러 지키면서 계책에 맞게 호응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장계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에 나온다.
1·3차 출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령이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200년 이후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반면, 이번에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이 직접 거북선을 소개한 '당포파왜병장' 문헌을 비롯해 최근까지 확인된 사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뱃머리에 있는 용머리와 거북등 모양의 덮개.
현재 전시관으로 운영 중이며 1999년 1차와 같은 형태의 2차 거북선을 만들어 해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충무공의 장계인 ‘당포파왜병장’ 내용 중 일부.
이번 3차 거북선은 ‘이충무공전서’에 있는 통제영 귀선을 근거로 하되 임진왜란 당대의 기록인 충무공의.
토대로 전라좌수영 귀선도와 통제영 귀선도를 혼용해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진왜란 당대 기록인 이충무공 장계 '당포파왜병장' 등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쳤습니다.
예산 29억 원이 투입돼 4년만에 복원된 거북선은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섬 오랑캐가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고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 당포에서 왜병을 물리친(1592년 임진 5월 29일당포파왜병장·唐浦波倭兵狀) 보고서다.
이순신의 전쟁 서사(敍事)는 완벽주의다.
바람에 거북선의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논문은 임란형 재현 거북선은 관련 기록인 ‘당포파왜병장’과 이순신 ‘행록’ 등을, 후기형은 ‘이충무공전서’의 권수 도설(卷首 圖說)을 토대로 비교 분석했다.
- 이전글바다와 함께: 해양 생태계의 아름다움 25.06.27
- 다음글꿈의 시작: 목표를 향한 첫 발걸음 25.0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국토건[주]](http://jkst.co.kr/img/ci.sv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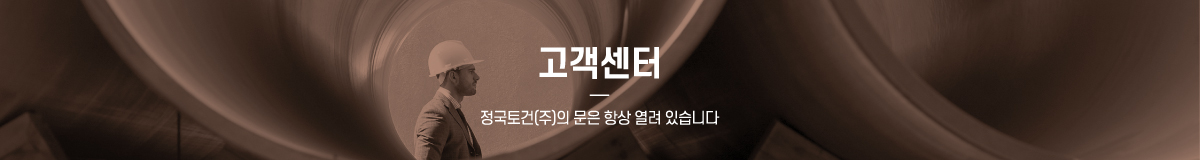
![정국토건[주]](http://jkst.co.kr/img/ci_bt.svg)